
사람 건축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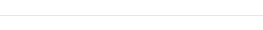
기 억 상 실 의 시 대
얼마 전 우리집 아랫동네에 새로 신축된 아파트가 들어섰다. 횡단보도 앞 신호등을 기다리며 건너편의 그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틈에 몇 채가 완공되어 우뚝 솟아 있었다. 문득 나는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이곳은 원래 무슨 풍경이었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런데 떠올리려 할수록 당혹스러웠다.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았다. 10년도 넘게 살아오며 지나쳐왔던 동네인데 어찌 기억의 한 단편도 떠올릴수 없다는 것인가? 주변 풍경에 아둔한 나의 감각 때문인가? 자책하다가, 매일 곳곳에서 낡은 건물이 부숴지고 새 건물이 들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장소에 대한 기억상실증’ 은 비단 내 개인적인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 도시의 병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나’ 들과 현재의 ‘나’ 를 연속선상에 위치시켜 놓는 '자기동일성'의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에 대한 기억들의 종합이 내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 도시문제로 빗대어 보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매일 다시 지어지고 또 다시 몇년 안가서 파괴되는 우리 도시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도시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거기서 기인한 병명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장소에 대한 기억상실증이다. 그리고 도시의 문제는 곧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도시의 병명을 그대로 떠안고 살아가야 할 판국에 왔다.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점차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기억상실증은 점점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평소 존경하던 정기용 건축가는 그의 저서, <사람 도시 건축>에서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이런 도시의 문제를 제기한다. 옛날부터 건축이란 거주에서 비롯되었으며, 모두가 알듯 거주란 장소성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우리 생활의 중심이며 세계를 받아들이는 신성한 장소라 한다. 그러나 모두가 알듯 이러한 ‘거주’ 개념과 ‘집’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사람들은 더 이상 거주하기 위해 집을 살지 않으며, 더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해 아파트를 구매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될수 없으며 장소성을 잃고 끝없이 부유하기만 한다. 정기용은 현대인들을 빗대어, 설령 부동산을 가지고는 있으나 진정으로 거주할 줄 모르는 자들 역시 ‘홈리스’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좋은 장소에 대한 체험이며 교감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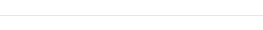
유적은 시간의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기억의 무게로 결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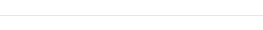
그의 말대로 장소에 대한 좋은 기억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전국의 땅이 부동산화되고 화폐화되면서 들어선 상징적인 건물은 아파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는 주거의 목적이 아닌 채로 도처에서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한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아파트’ 조차 그 곳에 사람들이 살고 그 나름의 시간과 역사가 쌓여 진정한 ‘거주문화’의 모습을 보이려는 찰나에, 또 다른 새로운 아파트의 출현으로 파괴된다는 사실이다. 독립출판으로 유명해진, 재개발 위기에 처해있는 자신의 아파트와 추억을 지켜내자는 목적으로 한 평범한 시민에 의해 씌여진 <안녕, 돈촌주공아파트> 책을 구입해서 본 적이 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 하면 떠올리는 것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어진 멋대가리 없고 몰개성한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 이라고 떠올린다. 하지만 저자에게 돈촌주공아파트는 사회적, 미학적 의미를 떠올리기 이전에 그냥 자신의 추억과 삶과 유년시절의 기억이 온전히 베여있는 ‘집’ 그 자체였다. 만약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게도 장소에 대한 역사가 오랜기간 이뤄질 시간이 확보된다면, 자신에게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씻을 수 있고 진정한 ‘거주’를 실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획득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파괴되기 위하여 지어진다. 재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단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이 공유했던 과거가 송두리째 날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한옥이던 아파트이던 간에, 우리는 ‘거주’를 이룩하려는 찰나마다 기억상실을 강요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제는 돌아가신 정기용 선생의 삶과 지금 태어나는 세대의 삶을 조직하는 환경은 매우 다르다.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기용 선생이 언급한대로 진정한 주거의 문화를 맛본 사람들이고, 이제는 사라져가는 전통적 가치에 대해 한탄하는 것은 당연하다. 80년대에 태어나 유년시절을 아파트에서 보낸 나 이지만, 최소한 정기용 선생의 글을 읽으며 그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이미 가상현실이 지배하고 장소성이 파괴된 세상에 태어나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거주’ 니 ‘좋은 건축’ 이니 해봤자 씨알도 안먹힐 것이다. 그들은 장소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겐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간에 가상현실로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기타 전자기기만 눈 앞에 휴대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들에겐 ‘안정된 거주’ 의 조건이 아닐까?
어쨌든 나는 20세기의 사람으로서, 책을 읽으며 정기용 선생의 모든 비판적인 문제제기에 동의를 했으며 우리 시대가 그가 지향하는 세계로 점차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축이란 단지 개인의 취향을 물질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풍경의 일부로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에도 격하게 동의하는 바이다. 건축가에게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끝없이 묻고 있는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회화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 <말하는 건축가>를 보면서 나도 정기용 선생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화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현재 회화가 가지고 있는 사회, 윤리적 문제는 무엇일까? 회화에서 사회적 유용성은 어떻게 획득되는 것인가? 이 시대에 화가로서의 윤리적 실천은 무엇일까? 실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마크다운 디자인 by @kyunga

